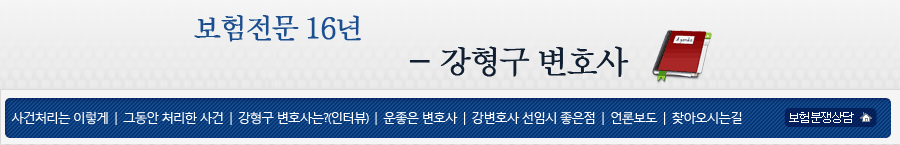
보험사에서나 감독당국(금융감독원)에서나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백수보험 계약자들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법적분쟁으로 치닫는 것뿐이다. 하지만 보통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기는 쉽지 않다.
또한 '실세금리에 연동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보험사측의 주장 역시 합당해서 법률적으로도 해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 전문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계약자의 사례를 통해 조언을 구해봤다.
전문가/강형구 변호사 ‥ "과장광고로 상품 판 보험사도 책임"
강형구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60% 이상이 보험과 관련 있는, 국내에서 드문 보험분쟁 전문 변호사다. 현재도 여러 다른 보험 관련 분쟁과 함께 두 건의 백수보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 건은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다른 건은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이 상대. 백수보험 계약자들은 언론이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보험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강변호사를 찾아오고 있다고 했다.
강변호사는 백수보험 문제는 요컨대 '상품을 팔면서 과장광고를 한 경우'라고 축약했다. "시중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속한 매년 1,000여만원의 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성격을 지닌 상품임을 똑바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대한교육보험건의 경우 법정에서 논쟁의 핵심은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다. 계약자측은 상식적으로 확정배당금이라 하면 당연히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배당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 이율에 의해 변동되거나 배당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10년간 연 100만원씩밖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애초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사측은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는 그당시 백수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에서도 공공연히 사용하던 표현으로,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정이율과 실세이자율 간에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에서 정부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강변호사는 다른 백수보험 계약자들에게 "팸플릿 등 인쇄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리변동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진다는 단서가 없는 경우, 보험모집인이 확정배당이라 말했다고 확인해줄 수 있는 경우 등이라면 소송을 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패소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하라고 설득하거나 권하지는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중간에 해약하지 않고 남아 있는 백수보험 계약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백수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강변호사는 "보험사라고 무조건 다 이기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보험분쟁이든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하려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일단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지레 항복하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백수보험 가입자/이경복씨 ‥ "보험금도 문제지만 무책임한 보험사 태도 때문에 끝까지 해보고 싶다"
이경복씨는 기자를 만나자 오래돼 색이 바랜 신문기사와 보험증서, 가입할 때 모집인이 주고 간 팸플릿 등을 꺼내놓았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진작부터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80년 7월, 32살이었을 때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먼 친척을 통해 대한생명의 백수보험에 가입했고 매달 3만3,200원씩 보험료를 납입했다. 지금은 매달 3만여원이 하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때 이씨가 받던 월급이 1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다른 백수보험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씨도 7년 동안 보험료를 낸 뒤 55세가 되면 75세가 될 때까지 매년 1,5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받은 상품설명서에도 그렇게 써 있었다. 보험금을 받으면 노후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고 '순조롭게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당시에는 자동이체 같은 것이 없어서 매달 꼬박꼬박 지로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귀찮아서 해약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해약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는 만류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보험사 직원이 매우 불친절하게 응대하면서 '해약하려면 하라'는 투로 대답을 했던 것이다. 의아해진 그는 마침 다른 보험사에 다니고 있던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친구는 "요새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상품의 해약을 유도하고 있다. 계약자에게 매우 유리한 고수익 상품이니 절대 해약하지 말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라"고 충고해줬다.
그래서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던 중에 언론에서 백수보험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한두 차례 접하게 됐다. 이때부터 이씨는 관련 신문기사를 스크랩도 하고, 보험증서와 당시 받았던 팸플릿도 다시 갈무리해 잘 보관하는 등 나름대로 분쟁에 대비를 해 왔다. 2003년 7월 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왔다. 여의도에 있는 보험사를 찾아갔지만 보험사의 대답은 예상대로 1년에 100여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에도 호소를 했지만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분쟁해 해결하는 것 외에 감독당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지금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험소비자연맹 등의 조언을 토대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하겠다는 이씨는 과거에 다른 보험건 때문에 보험사와 다툰 경험도 있다며 보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할 때 '모집인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모집인에게 손해를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부정확하게 상품을 판매해 계약자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그 책임을 모집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계약자나 모집인이나 대형보험사 앞에서는 모두 약자입니다. 어째서 감독기관이나 법이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보험금도 문제지만, 무책임한 보험사의 태도를 고쳐 놓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볼 겁니다." 이씨의 결심은 매우 단단해 보였다.
2004. 2. 1.
김수연 기자 soo@kbizweek.com
|
강형구변호사사무실 |